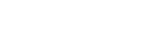리뷰 네비게이션
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본문내용
지식자료
- 제목 문헌 속의 버섯 역사
- 등록일 2014-03-15
- 조회수 13
- 등록자 장현유
- 첨부파일
- 문헌 속의 버섯 역사 한국농수산대학 버섯학과 장현유 교수/hychang@af.ac.kr 버섯의 역사는 약 1억3천만 년 전으로 초기 지구로부터 존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지구에 존재하는 버섯의 종류는 14만여종이 생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중 15천여종이 조사되었다. 버섯은 고대문명 발상지와 화려한 명성을 떨친 곳의 어디에나 알려져 있었다.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버섯이 너무나 맛이 좋기 때문에 평민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엄명을 내리고 자신들이 독차지 하려고 하였다. 파라오는 고대 이집트의 정치적·종교적 최고 통치자로서 '두 땅의 주인'이라는 칭호와 '모든 사원의 수장'이라는 칭호를 겸하고 있었다. 이 때 '두 땅의 주인'이란 파라오가 상이집트와 하이집트 전체의 통치자라는 의미로, 파라오는 두 지역의 모든 토지에 대한 소유권, 법률집행권, 조세의 권리와 함께 두 지역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한편 '모든 신전의 수장'은 파라오가 지상에서 신을 대신한다는 의미로, 파라오는 제사의식을 주관하고 신전을 건설했다. 로마인들은 버섯을 먹을 수 있는 계층을 귀족으로 한정하였는데, 뒷날 버섯이 병사들의 힘을 북돋운다고 믿게 된 후로는 그들에게도 먹도록 허락하였다. 기원전 456∼450 년경의 이카루스(Icarus)의 말 속에도 독버섯의 중독사고 이야기가 나온다. 여기서 이카루스는 그리스 신화 중 어리석음과 과욕을 상징하는 인물로 태양을 향해 높이 솟아올랐다가 너무 높이 날아올라 날개에 쓰인 초가 녹아 바다로 추락한 인물이다. 인도의 석가모니는 열반에 들기 전에 버섯을 먹었다고 한다. 열반은 불교에서 수행에 의해 진리를 체득하여 미혹과 집착을 끊고 일체의 속박에서 해탈(解脫)한 최고의 경지를 말한다. 로마의 네로황제(A.D 37∼68)는 달걀버섯을 매우 즐겼는데 백성이 버섯을 따서 가져오면 그 무게만큼의 황금을 상으로 내렸다고 한다. 네로황제는 로마의 제5대 황제이다. 잔인하고 포악한 성격으로 의붓 동생과 어머니 등을 죽이고 그리스도인에게 화재의 책임을 물어 몰살시키는 등의 악행을 저질렀다. 반란이 일어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황제 클라우디우스 1세의 둘째 아내인 소(小) 아그리피나비(妃)의 전 남편(가이우스 도미티우스 아헤노바르부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클라우디우스의 양자가 되었다. 54년 어머니가 클라우디우스를 독살하고 근위병의 추대를 받아 제위에 올랐을 때 불과 16세였다. 치세의 초기 약 5년 동안은 근위장관 브루투스, 철학자이며 그의 스승인 세네카의 후원으로 해방노예의 중용, 감세, 원로원 존중, 매관매직의 폐단을 시정하는 등의 선정을 베풀었다. 그러나 점차 잔인포악한 성격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의붓 동생 브리타니쿠스, 어머니, 비(妃) 옥타비아를 차례로 살해하였다. 특히 브루투스의 병사(病死)와 세네카의 은퇴는 그의 난행의 도를 심화시켜 치정(治政)은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다. 64년에는 로마시 대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교도에게 전가시켜 대학살을 감행하였으며, 그 폐허 위에 화려한 황금궁전을 세웠다. 또 원로원의원 피소 일파의 음모가 발각되었을 때는 세네카 ·루카누스를 포함한 고위 측근을 처형하였다. 한편, 그는 그리스 문화에 심취한 예술의 애호자로도 알려져 있다. 그리스의 체육 ·예술콩쿠르를 로마에 도입하고 스스로 극장무대에 서기도 하였으며, 그리스를 여행하며 사대제전(四大祭典)을 개최하고 경기에도 출전하였다. 68년 갈리아에서 반란이 일어나 이것이 각지로 퍼지자, 히스파니아(에스파냐)의 총독 갈바가 로마시로 진군하였을 때 그를 미워한 원로원, 일반 민중뿐만 아니라 그의 근위군까지 이들에게 합세함으로써 네로는 로마시를 탈출, 자살하였다. 이로써 율리우스클라우디우스왕조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폭군의 전형으로서 네로의 전설이 형성되었는데, 재위시에는 오히려 그의 활달한 성격 때문에 인기있는 황제로 알려져 죽은 뒤에도 제2 ·제3의 네로라고 일컫는 자가 나타났을 정도이다. 이집트인들은 버섯을 신 오르시스가 인간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였다. 멕시코와 과테말라의 인디언들은 특정한 버섯의 외형이 천둥번개와 관련되어 있다고 믿었다. 기원전 1,000∼300 년경의 유적으로 보아 종교나 신화에서도 버섯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버섯민속학의 한 분야를 주창한 미국의 왓슨(R.G Wasson)은 중국의 영지버섯에 관한 내력은 인도의 릿구, 베다의 영향이 인정된다고 기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기원전 2,000∼1,500 년경에 중앙아시아 코카사스지방의 유목민족인 아리아인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을 지나 인도에 이주하여 판잡지방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는데, 농경을 하면서 기원전 1,500∼500년에는 힌도우스탄 지방에서 바라몬교의 종교문헌집인 수종의 성경 베다가 만들어졌는데 이 베다에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제사를 거행할 때 소마(Soma)라는 음료를 마셨는데, 이것은 어떤 식물을 돌로 으깨어 그 즙을 우유와 섞은 것으로 마시면 환각상태에 빠졌다. 이 식물이 바로 광대버섯으로 알려져 있다. 1999년 발표한 와서와 웨이스(Wasser & Weis)의 버섯의 약효성분에 의하면 모든 버섯은 약리작용으로 종양 면역성을 길러 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영지버섯은 항염증, 항종양(항암), 항바이러스(에이즈), 항세균과 항기생물, 혈압조절, 심장혈관 장애방지, 면역조절, 강신장, 간장독성 보호, 신경섬유 활성화, 생식력증진, 만성기관지염 방지 등 12항목이 좋은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났다. 표고버섯은 항염증, 항종양(항암), 항바이러스(에이즈), 항세균과 항기생물, 혈압조절, 콜레스테롤 과소혈증과 지방과다혈증 방지, 항당뇨, 면역조절, 강신장, 간장독성 보호, 생식력증진 등 11항목으로 조사되었다. 느타리버섯은 항종양, 항바이러스, 항세균 및 항기생물, 심장혈관 장애방지, 신경섬유활성화 등으로 밝혀졌다. 1992년 치하라(Chihara)에 의하면 버섯의 항암성분 효과를 알아보면 목질진흙버섯(상황버섯)은 종양저지율이 96.7%, 송이는 91.8%, 팽이버섯은 81.1%, 표고는 80.7%, 구름버섯은 77.5%, 느타리는 75.3%, 잔나비불로초버섯은 64.9%로 나타났다. 따라서 버섯은 종류에 따라 그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작용하는 암 종류나 부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많은 종류의 버섯을 골고루 항상 섭취하는 것이 면역력을 길러 암 예방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버섯은 다른 미생물에 비해 식물을 분해하는 능력이 탁월한데, 농림 부산물을 태울 때 분출되는 고농도의 CO2, CO, CH4 가스와 미세분진으로 대기는 점점 오염되기 때문에 선진국은 이미 밀짚, 보릿짚 등의 소각을 규제하고 있으며, 생활 쓰레기 소각은 다이옥신 등 인체에 유해물질을 다량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버섯이 문헌에 최초로 기록된 것은 김부식(1145)의 삼국사기로 선덕여왕 3년(704)에 목균(木菌)인 금지(金芝)와 지하균(地下菌)인 서지(瑞芝)를 진상물로 왕에게 올렸다는 것이 시초이다. 그 후 조선시대에 선조가 명하여 광해군 때 허준이 1613년에 완성한 동의보감에 여러 가지 버섯의 약용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오고 있다. 여기에는 복령, 영지, 동충하초, 저령(Glifola umbellata), 송라(松蘿 Usnea logissima), 표고버섯(향초 香草), 뇌환(雷丸 Polyporus mylittae), 혹시루뻔버섯(Polyporus mylittae, Inonotus nodulosus), 목이, 석이(Umbilicaria esculenta, Gyrophora esculenta), 송이, 뽕나무버섯부치(Amillariella tabescens), 곰보버섯, 말똥진흙버섯(Phellinus igniarius) 등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 인조 때 홍만선이 저술한 산림경제(山林經濟)에도 송이와 복령 등이 식용 또는 약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의 버섯에 대한 인공재배 내력을 보면 1935년 일본으로부터 순수 배양한 표고종균이 도입되어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1955년 경기도 임목양묘장에서 양송이가 처음 시험재배 되었으며, 서울근교와 경남 진해 등지에서 동굴을 이용하여 양송이가 재배되었다. 그리고 1959년에는 제주도에서 양송이의 동굴 및 반지하식 시험재배가 이루어졌다. 1960년에는 산림조합연합회 특수임산사업소에서 일본임업시험장으로부터 양송이 종균을 도입하였으며, 1961년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양송이 종균을 도입하여 증식 배양한 것을 광주에 소재한 제일농산(주)과 인천근교의 방공호에서 시험 재배하여 그 이듬해에 광주에서 지하재배를 실시하였다. 1964년에 이르러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대한산림조합회 특수임산사업소에서 양송이 종균을 배양하게 되었으며, 이것을 전국에 보급함으로서 철도턴넬, 지하방공호, 연초건조장 등을 이용하면서 재배면적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1969년 국내 처음으로 버섯관련 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에 균이과(농업과학기술원 응용미생물과로 바뀌었다가 현재 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버섯과)가 설치되어 본격적인 연구 및 기술개발이 시작되었다. 이 때는 주로 양송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양송이 재배가 매우 성황을 이루게 되었고 또한 기업형 재배로 전체 농산물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효자 노릇을 하기도 했다. 느타리버섯의 경우 70년대 초반에 원목재배법이 개발되었고, 중반에 볏짚다발재배법이 개발되어 농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에 산업부산물인 폐면(廢綿)을 이용한 재배법이 개발되어 농가에 보급됨으로서 점차 재배면적이 확산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버섯으로 정착하였다. 최근 균상 및 원목재배용 배지재료의 구득난과 농촌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해 톱밥을 이용한 병재배법(甁栽培法)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1974년부터 농업과학기술원 응용미생물과에서 병재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1980년대 말부터 농가에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초부터 정부지원사업에 힘입어 재배농가가 급속도로 확산되어 2011년 현재 전국에 약 100개소의 병버섯 재배시설에서 년간 약 25,000톤의 병재배버섯이 생산되고 있다. 1990년을 전후하여 각도 농촌진흥원(현 농업기술원)에 버섯연구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지금까지 버섯연구에 박차를 가한 바 1990년대 중후반까지 버섯산업의 황금기를 구축해 왔다. 2009년도에는 버섯의 대표조직인 사단법인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회장 성대경)가 재탄생하여 정부의 권한을 일부 대행하는 체제로 발전하였다. 또한 이 대표조직인 사단법인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를 자문하고 싱크 탱크(think tank) 역할을 하는 한국버섯산업연구회(회장 장현유/한국농수산대학 교수)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활동을 하고 있다. 인류와 버섯 버섯에 대한 가장 오래된 고고학적 기록은 기원전 3500년경 북알제리아 동굴에 그려져 있는 타실리(Tassili)상이며, 이 그림을 보면 춤추는 무당의 온 몸 윤곽선에 버섯이 자라나 있는 듯하고, 손에는 큰 버섯을 여러 개 움켜 쥔 듯하고 있어 마치 버섯의 영적인 기운을 전신에 담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이처럼 과학이 발전하지 못했던 고대에는 버섯이 신비스럽고 두려운 대상으로 여겨져 종교의식이나 신화에 연관되어 졌었다. 이집트인들은 버섯을 신(神) 오르시스가 인간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으며, 멕시코와 과테말라의 인디언들은 버섯의 모양이 천둥 번개와 관련이 있다고 믿었고, B.C. 1000∼300년경으로 추정되는 유적으로 보아 종교나 신화 등에서 버섯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 왓슨(R.G. Wasson)이 주창한 '버섯 민족학'을 보면, 중앙아시아 코카사서지방의 유목민족인 아리아인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을 지나 인도에 이주하여 판팝지방에 정착하면서 농경생활을 하였는데, B.C. 1500∼500년경 힌도우스탄지방에서 바라문교의 종교문헌집인 수종의 성전 베다가 만들어 졌고, 이 베다의 기록에 의하면 제사를 행할 때 소마라는 음료를 마셨다고 한다. 이 음료는 어떤 식물을 돌로 으깨어 그 즙을 우유와 섞은 것으로서, 마시게 되면 환각상태에 빠진다고 하였다. 이 식물을 광대버섯이라 하여 주나라 말기인 B.C. 7∼3년에 마리아계 인도인에 의해 중국에 들어와 버섯을 숭상하는 사상이 전해졌다고 하는데, 광대버섯 대신에 영지버섯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중국의 갈공이 쓴 포박자(抱朴子)라는 책에서도 영지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도교사상 밑에서 대단히 진귀한 버섯으로 취급하였다. 그리고 버섯은 고대문명의 발상지나 화려한 명성을 떨친 곳은 어디에나 알려져 있는데, 이집트의 파라오인들은 맛이 너무 좋기 때문에 평민들이 버섯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엄명을 내리고 자신들이 독차지하려고 하였다. 로마인들은 버섯을 먹을 수 있는 계층을 귀족으로 한정하였으며, 그 후 버섯이 병사들의 힘을 북돋운다고 믿게된 뒤부터 그들에게도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중국 최고의 의약학 전문서인 신농본초경(新農本草經)에는 한방약을 365품목으로 나누고 이것을 다시 상품, 중품 그리고 하품으로 나누었으며, 이 중 상품은 '생명을 양(養)하는 목적의 것으로 무독(無毒)이면서 장기간 복용해도 부작용이 없어 몸을 경(輕)하게 하고 원기(元氣)를 회복하며 노화(老化)를 방지하고 수명(壽命)을 연장(延長)시키는 약효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120품을 적었는데, 그 중에 청지(靑芝), 적지(赤芝), 황지(黃芝), 백지(白芝), 흑지(黑芝), 자지(紫芝) 등 6종의 영지를 기록하였다.
※ 광고성 글, 타인에 관한 비방 및 명예 훼손에 관한 글,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 첨부파일 포함 )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경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